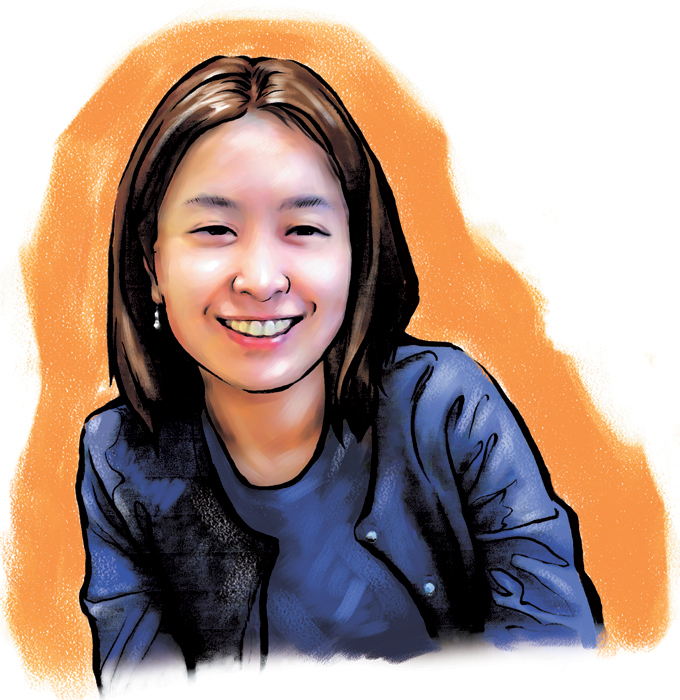“너 요즘 계속 얼굴이 까맣다. 아직도 몸이 안 좋니?” 엊그제 밤엔가 엄마가 물었다. “나 원래 까맣잖아요.” “아니야, 넌 원래 하얘.” 내 얼굴이 하얗다는 표현은 우리 엄마만이 쓸 수 있다. 내 피부는 아주 까매서 피부 하얀 내 친구들과 흑설탕, 백설탕, 이러고 놀 정도니까. 엄마 눈에야 내가 당신 딸이니 뭐든 예뻐 보이는 것뿐이다. 그런데 그런 엄마마저 나보고 까맣다고 했다면 이건 심각한 거다 싶어 거울을 들여다보려는 찰나, 나는 내 옆에 서 있는 엄마를 보게 됐다. 막 세수를 하고 나온 엄마는 머리칼들을 뒤로 넘기느라 쓴 헤어밴드를 미처 빼지 않은 상태였다. 그렇게 드러난 속 머리칼들이, 온통 하얬다. 믿을 수가 없었다.
엄마, 염색 안 해요, 요즘? 하고 물으려다 “염색약이 독한지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서 자주 못 쓰겠네”라던 언젠가의 푸념이 떠올랐다. 숱 많은 우리 엄마가 머리칼을 이래저래 갈라 보이며 “이것 봐, 이것 봐” 할 때도 나는 출근 준비에 바빠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다. 어쨌든 나는 헤어밴드 아래 눌린 백발을 보며 슬픔의 감탄사를 내뱉은 뒤였다. 진짜 슬픔을 감추기 위해 대충 슬픈 척을 해 보였다. “울 엄마 어떡해, 할머니 다 됐네!”
중한 것을 중하게 다룰 줄 모르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일깨우는 교훈적인 순간은, 이렇게 못된 방식으로 찾아온다. 나는 할머니가 돼버린 엄마 모습을 너무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날이 바로 그날일 줄 몰랐다. 철들면서 발견하고 수집해온 엄마의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떠올랐다. 한번은 늦은 마감을 끝내고 집에 들어가 쿨쿨 잠들어 있는 엄마 옆에 누워 잤는데, 딸의 모닝콜을 부탁받고 다음날 아침 전화한 엄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넌 이빨 가는 소리가 대체 왜 그렇게 크니? 엄마 밤새 한숨도 못 잤잖아!” 요전에 엄마는 이마트에 장보러 나갔다가 “무농약 딸기요, 무농약 딸기 사세요” 하는 과일 매대 직원의 말을 “무능력 딸기요∼ 무능력 딸기 사세요∼”로 알아듣고는 “무능력 딸기는 대체 무슨 딸기니?” 하셨더랬다. 내가 밤을 꼴딱 새워야만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엄마는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나서 새벽예배를 다녀오신 뒤 엄마의 스케줄에 맞춰 눈을 뜬 강아지 남이(본명: 美男)와 베란다를 뛰어다니며 논다. 언젠가 그 모습을, 마치 소리없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바라본 적이 있다.
내가 나이를 먹어가니까 엄마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다. 내 부모로서, 나와 같은 여자로서, 한때 나와 닮은 얼굴로 젊음을 누린 중년의 개인으로서. 그러고나면 내가 지금 들여다보는 그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매력적이며 눈부신 사람인가를 알게 된다. 난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다. 그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사랑받는 사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다.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걸 표현하고 싶다. 물론, 엄마에게 내 사랑과 동경심을 전하기는 쉽지 않다. 막상 엄마와 하루종일 붙어있으면 반나절도 안 돼 갑갑해지니까. 심지어 후회도 한다. 젠장, 내가 왜 그랬을까, 다음 주말도 있는데. 몇번의 시도 끝에 ‘역시 부모에게 효도하자면 엄청난 양보와 인내를 각오해야 함’을 깨닫고 차일피일 다시 미루던 차였다. 그러다 엄마의 백발을 봤다. 눈부신 당신의 백발. 중년 부인들에게 터부로 되어 있는 단어 ‘할머니’가 그날 새벽까지 내 마음을 어지럽혀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