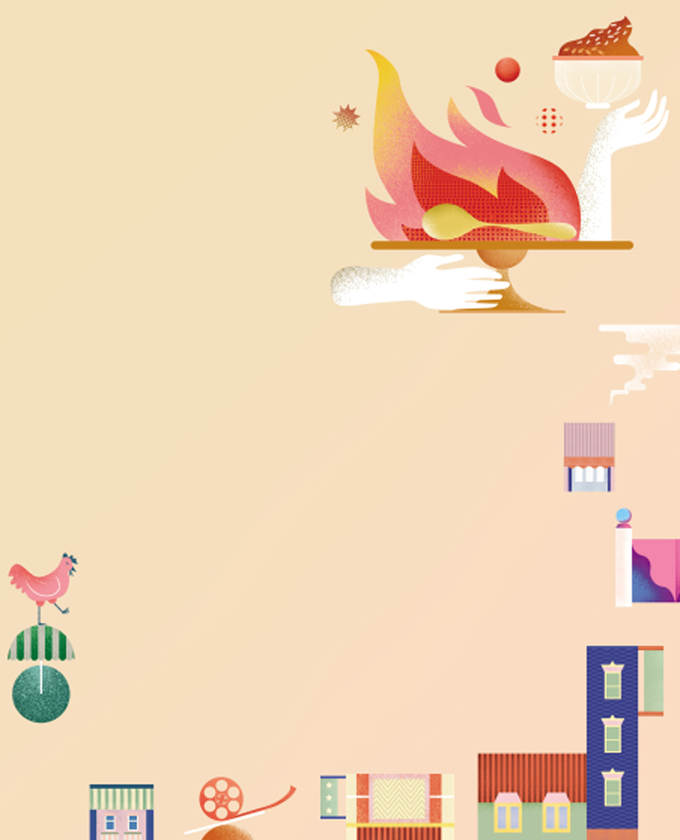죽집의 풍경은 대개 비슷하다. 대형 식당은 거의 없고, 식탁도 몇개 되지 않는 소박한 곳이 대부분이다. 아마 단체 손님을 받을 일도 드물 것이다. 죽이라는 음식에 왁자지껄한 풍경은 선뜻 떠올리기 어렵다. 분위기를 돋우기보다는 차분하게 혼자 혹은 둘이서 떠먹어가는 메뉴에 가깝다. 죽은 평소에 먹기보다는 주로 소화기능이 떨어졌을 때 찾거나, 아픈 누군가를 위해 포장해갈 때 찾는 순한 음식이다. 그래서인지 죽집에는 고요함이 있다. 시쳇말로 ‘인싸’라기보다는 그 반대 어딘가의 정서랄까. 종종 들르던 집 근처 프랜차이즈 죽집에 신메뉴 전단지가 붙었다. 죽집으로선 의외의 메뉴다 싶은, 화끈하고 얼얼한 매운맛의 불닭죽. ‘입안이 얼얼할 정도의 중독성 강한 매운맛을 좋아하는 고객 취향’을 반영했다는 설명이 함께였다. 포화된 외식산업 시장에서 살아남아보겠다는 서글픈 의지가 느껴졌다. 소비자가 모든 끼니를 다 외식으로 소비한다고 해도, 죽은 일인당 먹는 횟수가 크게 늘어날 확률이 높은 메뉴는 아니다. 게다가 식당과 음식은 이미 차고 넘쳐나지만 맛집 리스트에 죽은 없을 확률이 높다. 그런 식이라면 끼니 중에 죽이 순번으로 돌아올 확률은 더 낮아질 것이다.
괴식이니 무리수니 평가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등장하는 식음료 업계의 특이한 메뉴에는 이와 비슷한 고민이 담겨 있을 터다. 점점 더 늘어나는 소비자 선택의 가짓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든 관심을 받기 위해서 말이다. 욕을 먹을지언정 한번이라도 사서 먹게 만드는 편이 낫고,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인증 사진이 회자가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 그런 시류를 무시하기란 어렵다. 자기 상품에 집중해야 할 동기를 제시하지 못하면 결국 외면받게 되니 뭐라도 해봐야 한다.
언젠가 친구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동네 식당은 왜 줄줄이 폐업하는가?’를 물었다. 친구는 음식을 이유로 꼽았다. 그러니까 맵거나 달고 짜다는 수식어를 붙이기엔 거리가 먼,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 때문이라는 거였다. 백종원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런 언급을 한 적 있다. 싱거운 입맛을 가진 사람이 간이 센 음식을 먹었을 때는 단순히 음식이 짜거나 맵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입맛을 가진 쪽에서는 간이 약한 음식에 대해서는 그 음식 자체가 그냥 맛이 없다고 여기고 식당을 외면한다는 것. 따라서 간을 더 센 쪽으로 맞추는 게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더 이익이라는 얘기다.
어쩌면 영화와 같은 콘텐츠에도 이런 논리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극이 덜한 작품을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고 평가하기 쉽고, 그런 평가는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더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그렇게 시류는 모든 사람의 입맛을 맞추기엔 어려우니 맛에 대한 욕구가 강한 쪽, 즉 더 자극적인 기준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개인이 이 흐름을 돌파하거나 거스를 수 있을까.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 다만 작고 여린 여러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외에 뭐가 있을까. 그것은 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큰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도 쉽지 않은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