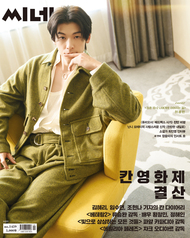'미지의 거장'. 좀 상투적이긴 해도 아르타바즈드 펠레시안을 소개하기에는 지금 이 말이 어울릴 것 같다. 그는 1938년 아르메니아에서 태어나 러시아국립영화학교를 졸업한 뒤 8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의 영화는 에이젠슈테인이나 베르토프와 비견될 만한 이른바 ‘디스턴스 몽타주’의 창시로 유명해졌고, 고다르가 그의 영화적 방법론에 여러모로 찬사를 보낸 바 있다. 5월2일 11시, 그가 머무는 호텔로 유운성 프로그래머가 찾아가 이런저런 궁금증을 꼼꼼하게 물었다. 1992년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의 주선으로 고다르와 대담한 것을 제외하면 그의 인터뷰는 매우 희귀하다. “원래 인터뷰를 정말 싫어한다”니 지금 이 지면은 매우 희귀한 자료 중 하나로 남을 것이다.
-강연 즐겁게 들었다. 어제의 강연 내용에 조금 덧붙여 물어보고 싶다. 바벨 이전의 언어 즉 인간의 언어가 존재하기 이전의 언어가 바로 영화 언어라고 말한 바 있다. 그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 =고다르와 대화할 때 그 말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니까 영화가 자기 자신의 고유한 언어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그 언어는 바벨탑이 세워지기 전부터 있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상용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라는 것이다.
-디스턴스 몽타주를 탈 몽타주(demontage)라고도 표현했는데 당신은 기존 소비에트 몽타주의 형식 원리를 부수면서도 한편으로 영화적인 감정이나 의미를 창조해내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 =그렇다. 전통적인 몽타주 즉 에이젠슈테인이나 베르토프의 몽타주를 보존하되 그런 몽타주 형식을 또한 벗어나는 몽타주를 디스턴스 몽타주라고 명명한 것이다(펠레시안이 말하는 디스턴스 몽타주의 핵심은 “‘붙이기’가 아니라 ‘흩트리기’다. 만약 각각 특별한 의미가 있는 두 개의 주요 장면이 있다면 함께 두어 연관을 맺기보다 둘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이 나의 목표다”라고 그는 <디스턴스 몽타주 혹은 디스턴스 이론>이라는 논문에 쓰고 있다).
-존재하지 않는 장면의 몽타주라는 표현도 쓴다. =보이지 않는 요소들로서 몽타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내 영화가 그렇고.
-사실상 몽타주라는 말을 당신이 할 때 그건 흔히 우리가 말하는 편집 개념으로서의 몽타주와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당신의 몽타주는 단지 편집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우주법칙과 비슷한 것이라 느껴진다. =그럴 수 있겠지. 전 우주 혹은 태양계 시스템에도 몽타주라는 법칙이 있을 거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있다. 우주적인 몽타주라고 말하는 건 그런 면에서 맞을 수 있다.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잡은 사람의 눈이 은하계의 익스트림 롱 숏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주장이 인상적이었다. 개별 사물이나 사건, 사람들의 사소한 연쇄를 통해서도 당신 영화는 우주적인 관념을 표현하는 영화가 되고 있다. =전통적인 몽타주의 원칙은 클로즈업과 미디엄 숏, 롱숏 등을 이용해 전체 장면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눈을 클로즈업한 그 한 숏이 이 세계 전체를 대변할 수 있다고 말할 때 정말 그걸 반대할 수 있겠나? 그런 의미에서 나는 중간 크기의 숏 없이도 익스트림 클로즈업과 익스트림 롱샷이 얼마든지 바로 연결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신은 물리적인 숏 사이즈가 아니라 심리적인 숏 사이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다시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롱샷, 클로즈업 등으로 구분해 생각하는 건 상투적이다. 롱숏으로도 클로즈업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당신이 90년대에 만든 작품인 <끝>, <생명>을 보면 스스로의 이론화작업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느낌도 있는데. =그러나 거기서는 숨겨진 형식의 디스턴스 몽타주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두 영화는 하나처럼 서로 처음과 끝이 호응한다. 하나의 대화인 셈이다. 예컨대, <끝>의 엔딩은 <생명>의 오프닝으로 이어진다. 두 영화 사이에 디스턴스 몽타주가 있다. 때문에 그 영화 중 한 영화만 볼 경우엔 그게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 두 영화는 함께 봐야만 서로가 한 작품처럼 구현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
-스위스에서 그 영화들을 보았을 때 나 역시 방금 말한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봤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 영화들은 개별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어떤 감흥이 성취된다. 방금 말한 <끝>이라는 영화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 있다. 기차안의 지친 사람들의 얼굴을 보여주다 감정이 차곡하게 쌓인 뒤 갑자기 숲의 풍경이 확 펼쳐지는 장면이다. 감정적 환기를 일으키는 예라고 할까. =정확하게 이해한 것 같다. 자세히 보면 승객들이 거기에 있고, 기차는 터널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산이 나오고, 다시 터널로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몽타주가 이뤄지는 거다. 터널의 끝이 빛의 시작과 생명의 시작으로 이어진다. 삶과 생명의 시작 말이다. 그게 <생명>의 오프닝으로 이어지는 지점이다.
-디스턴스 몽타주라는 작업이 폭넓게 극영화에도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당신은 말했다. 그런데 극영화에도 그것이 적용된다고 할 때 당신이 말하는 픽션의 의미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의미와는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싶다. 당신이 생각하는 픽션이란 어떤 형태를 일컫는 것인가. =배우들, 빛, 모든 것으로 할 수 있는 픽션이다. 디스턴스 몽타주는 아까 말 한대로 우주적인 몽타주다. 만약 어떤 전통적인 틀이 있다면 그 틀을 점점 더 확장하고 넓혀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상 당신이 만든 몽타주가 극영화에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은 이미 당신의 작업 안에 당신만의 픽션 요소들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 당신은 논문을 통해 극영화에서도 당신의 방법론을 쓸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 다큐멘터리라 불리는 당신 영화에서 이미 그걸 다 이뤄 놓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럴 수도 있다.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영화를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모든 영화의 장르는 극영화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류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 다큐도 넓게 보면 극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전문적인 배우들이 없을 뿐이지. 그건 용어의 문제다.
-<우리 세기>를 보면 상승, 하강을 통해 중력으로부터의 탈출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보인다. 영화를 보고나서 개인적인 인상은 연옥, 지옥, 천국이 교차되는 단테의 <신곡> 같다는 것이었다. =단테의 <신곡>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 영화는 인간의 영웅주의에 대해 말한 것이다. 우주 과학에 관계된 영웅주의 말이다. 하지만 단테의 <신곡>이라는 말을 듣고 나니 생각나는데 내가 그런 것에 관한 관심을 갖고 준비해놓은 대작이 있다. <호모 사피엔스>라고 한 30년전에 이미 시나리오를 완성해놓은 작품이다.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영화는 아직 못 만들었다. 아마 이 영화가 만들어진다면 디스턴스 몽타주의 완벽함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한다. 그러나 무척 많은 비용이 드는 제작이라 재정상의 문제로 아직 착수하지 못했다. 고다르도 내가 이 영화를 찍을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지만, 그 조차도 재정을 지원하는 건 힘들었다. 만약에 내가 그 영화를 만들게 된다면 백퍼센트 디스턴스 몽타주의 원칙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될 거다. 어쩌면 지금까지 당신이 본 내 모든 영화는 그 영화를 위한 연습 혹은 과정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호모 사피엔스>는 디스턴스 몽타주의 완결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간단한 질문이 지금 막 생각났다. 디스턴스 몽타주 이론을 떠올리게 된 계기가 있나. =나는 영화를 본성에 따라 제작했다. 내가 디스턴스 몽타주를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내 영화를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에이젠슈테인이나 베르토프의 영화와 비교해서 말했다. 나는 굉장히 놀랐다. 나는 그 사람들의 방법론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서야 그들의 몽타주 방법론을 분석해보았고 그 결과로 에이젠슈테인이나 베르토프 그들과 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 차이를 말하기 위해 논문을 쓴 것이고, 그게 바로 <디스턴스 몽타주 혹은 디스턴스 이론>이라는 논문이다. 영화가 먼저 있었지 이론이 먼저 생긴 건 아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영화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한 가지 걱정은 당신의 이론이 종종 오해받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어제 강연회에서도 어떤 질문자가 당신의 디스턴스 몽타주를 브레히트의 거리두기(소격효과)와 비교하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다. =내가 추구하는 몽타주는 일종의 구체(원형)를 향한 것이다. 하지만 관객이 그 구체를 이해하는 방식은 이런 파장일 수 있다(위 아래로 상승 하강을 반복하는, 마치 심장박동 그래프 같은 파장의 곡선을 그려 보여주면서). 하지만 이걸 관객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다. 관객이 내가 말하는 디스턴스 몽타주가 어떤 것인지 다 이해할 필요도 없다.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건 내 문제다. 그걸 몰라도 관객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