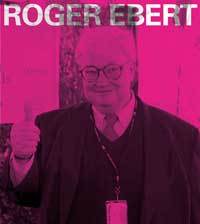시스켈과 에버트, 경쟁심이 낳은 명콤비
시카고에는 ‘시스켈 앤 에버트 로드’라는 길이 있다. 뉴욕에 비하면 문화적 변방에 불과한 시카고에서 전국적 영향력을 발휘한 두 평론가를 기념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시스켈과 에버트>는 매주 한번 30분 방영하는 쇼로서는 대단한 시청률을 유지했는데 그 비결은 무엇보다 두 사람이 적대적으로 보일 만큼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영화제작자가 고대하는 ‘Two Thumbs Up!’ 판정은 그만큼 받기 힘들었지만 시청자들은 상대방의 견해와 다른 각도에서 영화를 보는 콤비 플레이에 더 많은 흥미를 느꼈다. 둘의 경쟁심이 어찌나 대단했던지 시스켈은 몸이 아파 방송을 쉴 때도 “빨리 완쾌할 작정이다. 왜냐하면 로저가 나보다 많이 나오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뼈있는 농담을 했다. 둘은 다른 토크쇼에 초대손님으로 나와서도 사회자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모습을 보이며 시청자를 즐겁게 했다.
하지만 그들이 순전히 쇼를 위해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각자 지지하는 영화는 정열적으로 변호하고 싫어하는 영화는 가차없이 비판하면서 둘의 말다툼은 격렬해졌다. 99년 시스켈이 뇌수술 합병증으로 숨지자 에버트의 새로운 파트너가 누가 될지 궁금해진 것도 흥미로운 논쟁엔 어울리는 맞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망에 오른 사람은 많았지만 결국 시스켈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시카고 선타임스>의 젊은 컬럼니스트 리처드 로퍼. 평론가 경력이 거의 없는 인물이라 방송 초기 상당한 비판이 있었지만 <에버트와 로퍼>가 <시스켈과 에버트>에 비해 심각한 시청률 하락을 겪고 있지는 않다. 젊고 잘생긴 로퍼는 <피플>이 선정한 2001년 ‘결혼하고픈 독신남 50인’ 가운데 하나로 뽑히기도 했다. 여전히 <시스켈과 에버트>에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만, 에버트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 로퍼를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쇼를 끌어가고 있다.
방송으로 스타가 됐지만 에버트는 글쓰기를 멈춘 적이 없으며 그의 영화평은 미국의 저널리즘 비평에서 또 하나의 모델이다. “너무 긴 훌륭한 영화란 없다. 너무 짧은 나쁜 영화도 없다”는 식의 쉽고 간결하며 재치있는 문장이 에버트의 트레이드 마크. 그가 <뉴욕타임스>의 자넷 매슬린, <LA타임스>의 케네스 튜란, <타임>의 리처드 콜리스와 리처드 시켈, <뉴스위크>의 데이비드 얀센 등과 더불어 미국 저널리즘 비평의 대표적인 논객으로 꼽히는 것은 TV의 힘이 아니었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는 스콜시즈, 알트먼 같은 대가들의 영화를 강력히 옹호하지만 작가영화만 인정하는 평론가는 아니다. <리쎌 웨폰>이나 <스피드>처럼 잘 만든 오락영화에도 최고 평점인 별 넷을 선사하며 영화의 대중예술적 가치도 높이 평가하는 쪽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미국영화가 격변하고 비평의 권위가 절정에 달하던 60년대 후반부터 영화평을 썼다는 사실이다. <할리우드 문화혁명>에서 저자 피터 비스킨드가 지적했듯 60년대 말부터 70년대 말까지 10년간은 할리우드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의 물결에 휩쓸린 시기였다. 언젠가 평론가 수잔 손탁은 “영화의 100년 역사에서 이 시기는 대학생과 젊은이들 사이에 영화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논하려는 열정이 광범위하게 싹튼 시기였고 영화는 더이상 비밀종교가 아닌 것이 됐다”고 썼다. 아서 펜,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마틴 스코시즈, 로버트 알트먼, 스티븐 스필버그, 조지 루카스 등 재능있는 젊은 감독들이 할리우드를 변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는 동안 정열적인 평론가 폴린 카엘이 미국 평단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논객으로 떠올랐다. 스튜디오가 <내쉬빌>의 몇몇 장면을 잘라내려 했을 때 로버트 알트먼이 그녀에게 영화를 보여줬고 카엘의 극찬으로 그 장면들을 살려냈다. 당시 평론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웅변하는 일화.
하지만 블록버스터 전략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1975년 스필버그의 <죠스>가 전국 409개 극장에서 동시개봉해 1억달러 넘는 수익을 올리면서 시작된 블록버스터 시대는 인쇄매체에 실리는 영화평의 영향력을 급속히 감소시켜갔다. 이제 영화평은 <아마겟돈>이나 <맨 인 블랙2> 같은 블록버스터를 보러 가는 관객에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죠스>가 개봉된 해인 1975년 처음 전파를 타기 시작된 <시스켈과 에버트>가 주목받은 것은 그것이 인쇄매체가 아니라 TV라는 엄청난 네트워크를 가진 매체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에버트는 카엘처럼 펜으로 동시대의 재능있는 감독들을 구원할 기회를 자주 접하진 못했지만 TV의 힘을 빌려 입지가 줄어드는 영화평의 활동영역을 지킨 셈이다.
35년 동안 멈추지 않는 엄지손가락, 영원히
자기 엄지손가락에 상표등록까지 했지만 에버트는 손가락을 올리고 내리는 일, 영화에 별점을 주는 일을 “내키지 않는 짓”이라고 말한다. 문자로 옮길 때 생기는 향기가 그를 취하게 만들며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것도 별점이 아니라 글의 매력이라는 것이다. 1년에 250편에 달하는 신작영화를 보고 평을 쓰는 작업을 35년간 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일의 즐거움에 들뜬 사람처럼 보인다. 2주에 1번씩 고전 걸작을 다시 보며 금방 구워낸 것처럼 따끈한 영화평을 쓰는 한편 지난해엔 재평가될 영화들을 모아 자기 이름을 건 영화제를 개최했으며,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걸작이라고 믿는 알렉스 프로야스의 <다크 시티>를 위해 DVD 오디오 코멘터리 작업을 했다. 아마 지칠 줄 모르는 이런 정열이야말로 <시스켈과 에버트>의 장수를 가능케 했고 오늘날 그를 미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평론가로 만들었을 것이다.글 남동철 namdong@hani.co.kr 김혜리 vermeer@hani.co.kr·디자인 임정숙 norii@hani.co.kr
<<<
이전 페이지
기사처음
다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