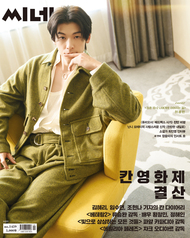<사이에서>는 무속인 이해경씨와 그를 둘러싼 무속인들의 삶과 선택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이례적인 성공을 거뒀던 다큐멘터리 <영매-산 자와 죽은 자의 화해>(2003)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관객의 입장에서 <사이에서>의 과제는 명확하다. 인류학적인 시선을 유지하면서도 삶과 죽음을 매개하는 이들을 통해 풍부한 감성을 이끌어냈던 <영매>와 자신이 어떻게 다른지를 증명함과 동시에, <영매>를 넘어서야만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주에서 처음 공개된 <사이에서>는 그 한계를 극복했다. <영매>와 달리 <사이에서>는 한명의 주인공을 통해 무속의 의미와 깊이를 보여주는 전략을 취하면서도, 과도한 감정이입과 격한 감정은 최대한 배제한다.
Q채널에서 7년간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이창재 감독이 해외배급용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달라는 의뢰를 받고 시작한 영화의 제작과정은, 감독 자신이 무속을 이해하게 된 과정과 일치한다. 준비를 위해 60여명의 무속인을 만나는 동안, 사기꾼과 진짜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종교학과 교수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던 그는, 진도굿, 서울양반굿 등 다양한 굿 중에서 “험한 뱃사람을 상대로 하기에 단조롭지만 전투적이고, 가짜가 자리잡을 수 없는 황해도굿”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을 결정했다. 그리고 이해경씨를 주인공으로 택했다. 워낙 실력이 좋아 PR을 목적으로 취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그는 진정한 위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다. 돈이 없는 이들에게는 때때로 공짜 굿도 마다 않는데, 아픈 이들을 외면하면 자신의 몸이 먼저 아프기 때문이다. 또한 마지막까지 지금의 삶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결국 아들은 먼저 보낸 뒤 죄의식과 가책으로 무당이 된 그의 삶은 그 자체로 드라마였다.
이창재 감독은 이해경씨가 “성질이 아주 드럽고(웃음), 괄괄한 분이어서 서로 많이 싸웠다”고 말한다. 굿은 일종의 종합예술이고, 일반적인 무당과 달리 모든 제례의 의미와 배경을 꿰고 있는 이해경씨는 일종의 예인(藝人)이었다. 굿을 촬영하는 사람이 그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엉뚱한 것을 찍는 등 소위 장단을 맞추지 못할 경우 불 같이 화를 냈다. 편집과정에서는 굿을 그저 이야기의 소재로만 삼았다며 자신의 출연 분량을 모조리 회수하겠다고 할 정도로 갈등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감독은 이해경씨가 결국 감독의 의사를 존중하는 털털한 성격의 소유자인지라 현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돌이켜보면 촬영 과정에서도 그는 언제나 협조적이었다. 덕분에 이창재 감독은 이해경씨가 제자로 받아들인 인희씨가 동트는 바닷가에서 처음으로 접신을 경험하는 순간을 영화의 오프닝에 담을 수 있었다. 접신을 두려워하면서 거부하는 인희씨에게 엄하고도 너그러운 선생은 끊임없이 편하게 몸을 맡길 것을 일깨운다. 이 장면은 운명을 피하려 안간힘을 썼지만 끝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무속인들의 몸부림을 단번에 전달한다.
이밖에도 이창재 감독이 촬영 중 맞닥뜨린 기이한 일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며칠 뒤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졌고, 첩첩산중에서 내림굿을 하는 동안에는 한 사람의 몸안에 들어있던 예닐곱명의 혼이 차례로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제작팀의 스탭 일부는 겁에 질려 도망갔다. 감독 역시 “깜깜한 밤중에 소리만 들리는데 카메라를 들고 바로 그 앞에 있으려니, 아이의 목소리부터 늙은 어른의 목소리까지 별의별 종류의 목소리가 다 들렸다. 그 혼이 나에게 들어오면 어쩌나 싶은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회고한다. 그러나 완성된 영화는 그저 담담하다. 모든 굿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작두타기 절차에서도 그의 카메라는, 날카로운 작두 위로 연약한 발을 내딛는 모습을 클로즈업으로 따라가고픈 욕망을 끝내 억누른다. ‘무속의 모든 것을 믿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감독은 “우리의 무속 역시 엄연한 종교임을 깨달았다. 우리는 기독교나 불교가 말하는 기적에 대해 과학적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며 현답을 내놓는다.
<사이에서>는 사진 자료를 이용한 회상이나 설명 없이 이해경씨의 사연 많은 삶을 전달한다. 어린 나이에 무병을 앓는 동빈, 내림굿을 거부하는 인희, 숱한 악재 끝에 운명을 따를 것을 결심하는 명희의 사연을 삽입함으로써 이해경씨의 삶을 보여준다. 신과 인간을 위해 살지만 그 사이에서 천대받는 무당의 운명을 의미하는 제목은, 영화의 형식과 그렇게 어울린다. 또 한가지 눈에 띄는 것은 감독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한 내레이션. “성우 목소리로 녹음을 해봤지만 너무 거짓말 같았다”는 감독은, 무당들의 풍진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여지껏 인생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았는데 모두에게 그걸 적용할 수는 없음을, 무당은 직업이 아니라 숙명임을 아는 것이 무당에 대한 이해의 핵심”임을 깨달았다. 객관적인 호기심이 주관적인 이해로 연결되는 과정을 마무리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넣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다. 이창재 감독은 애초에 해외관객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작업이지만, <사이에서>가 과연 그 타겟에 어울리는 작품인지는 아직도 모르겠다며 고개를 젓는다. 분명한 것은 여전히 겹겹의 편견 속에서 무당을 접하는 이 땅의 관객들에게 이 영화가 유효하고도 사려깊은 화두를 던져준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