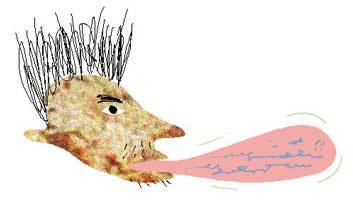쟁점 3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이 40%가 넘었으니, 축소 또는 폐지해도 되지 않나.”
반론3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
40%? 따지고보면 정부 스스로가 유지하겠다고 한 것이다. 넘었으니 우리 그만 하겠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영화인들이 따질 수 없는 문제는 절대 아니다. 영화인들이 그때까지라고 요구한 적은 없으니까. 혹 40%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손 치자. 한국영화 산업의 안정성을 의미하기 위한 통계적인 평균지표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해 40%를 넘었다고 그게 확보되지는 않는다. 내년에 35%로 떨어지면 다시 쿼터가 필요하다고 할 때 부활시켜줄 것인가. 다시 말하지만, 스크린쿼터제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영화인들을 비롯해서 시민단체들의 주장의 핵심은 몇%라는 수치에 있지 않다. 대신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한 거대 축적자본 앞에서 그 어느 나라의 상황도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자 함이고, 각인시키고자 함이다. 항상 위기일발이고, 풍전등화의 상황인 것이다. 거대자본은 이를 두고 자유경쟁을 해치는 장벽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건 전적으로 거대자본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일 뿐이다. 더 먹을 수 있는데, 더 먹지 못하니 분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문화,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전세계 80%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할리우드야말로 독점과 불공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할리우드 독점 견제, 문화종다양성 확보, 영상산업 발전 등 모든 관점에서 쿼터제가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쟁점 4 “대박 한국영화들 등쌀에 쿼터가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 한 일이 뭔가?”
반론4 조영각(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건 누가 하는 말이냐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할 바에는 쿼터가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라는 무용론자의 입장에 서보자. 그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든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말을 돌려 생각해보자. 그 말대로 쿼터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느냐는 거다. 과연 그럴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영화가 자리잡고 있는 스크린에 또다른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들어갈 것이다. 데이비드 린치의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할리우드 직배사들의 영화를 좀더 손쉽게 볼 수 있을 뿐이다. 즉, ‘문화적 다양성’은 할리우드영화에 비해 왜소한 한국영화의 몫을 줄이고,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또다른 입지와 명분과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미국의 한마디에 매번 위기가 닥쳐오는 상황에서 쿼터를 신축성 있게 논의하자는 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컸다. 또 스크린쿼터 문화연대가 본격적으로 감시활동에 나선 것도 채 10년이 되지 않았다. 그 전에는 유명무실한 제도 아니었는가. 스크린쿼터제를 두고 획일적이라는 비판도 가능하겠지만, 그건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주장이다. 한국영화 산업이 움트려 하는데 그걸 짓밟으려고 해선 곤란하다. 이러한 기반을 마지노선으로 갖고 있어야 시네마테크 전용관, 독립영화 전용관 등도 가능해진다. 갖고 있는 산업기반이라곤 아무것도 없는데, 독립영화 쿼터제를 시행하라고 하는 것도 우습지 않은가.
쟁점 5 “쿼터제는 한국영화의 경쟁력 강화를 막는 과보호 조치일 뿐이다.”
반론4 심재명(명필름 대표)
스크린쿼터제가 과보호 조치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무엇보다 쿼터제 포기를 의미하는 ‘개방’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은 듣기에 그럴싸할지 모르지만 궤변일 뿐이다. 최근 들어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는 한국영화계를 보면, 이는 쉽게 알 수 있다. 과거 20%대의 점유율을 갖고 있던 한국영화가 지금의 수준에 오른 것도 따지고보면 쿼터제 덕분이었다. 명필름에서 만든 <접속>만 해도 그렇다. 1997년 당시 극장들은 이 영화를 흔쾌히 걸려고 하지 않았다. 쿼터를 지키기 위해 극장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내건 셈이었다. 하지만 관객은 몰렸고, 흥행에 성공한 것이다. 만약 <접속>이 없었더라면 <공동경비구역 JSA>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 쿼터는 작은 영화, 예술영화를 지켜내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와·라·나·고 영화제’를 연 서울의 한 극장도 스크린쿼터 일수를 채우지 못해 이 행사를 기획했다. 가뜩이나 대박영화 위주로 극장의 판도가 구성되고 있는데, 그나마 쿼터라도 없다면 이들 영화가 발붙일 수 있는 곳을 더욱 없어질 것이다. 대만의 경우 할리우드영화에 무방비로 노출돼왔고, 허우샤오시엔 같은 세계적인 대가의 예술영화는 자본을 구하기는커녕 대만 내 극장에서 개봉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만약 대만이 이제 와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자국 영화산업을 부활시키려 한다 해도 빠른 시일 안에 할리우드영화에 길들여진 관객을 불러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가 경쟁력을 갉아먹은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닦아줬다고 할 수 있다. 정리 문석 ssoony@hani.co.kr·이영진▶ 스크린 쿼터가 위험하다
▶ 한-미투자협정 체결합의 뒤 쿼터를 둘러싼 한 · 미 정부의 입장 및 발언
▶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5인의 진실 혹은 대담 (1)
▶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5인의 진실 혹은 대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