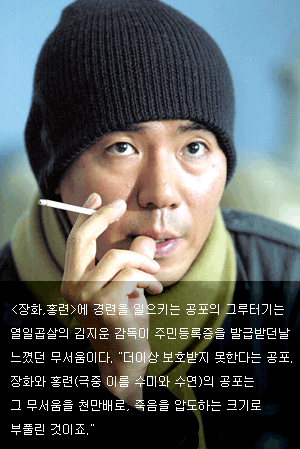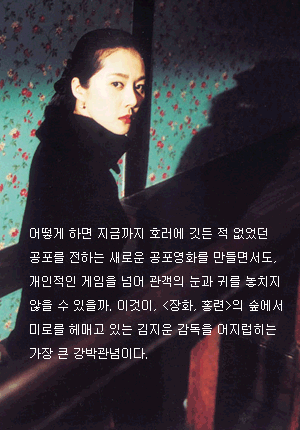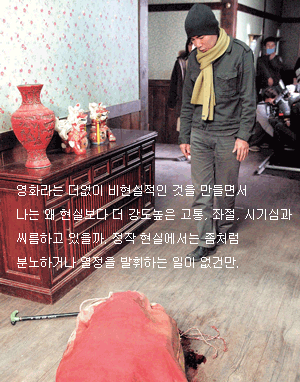내게 영화는 까다로운 생물
김지운 감독은 스스로 “배우를 엄청 많이 탄다”고 표현한다. 장화와 홍련을 무덤에서 일으켜세우고 집을 지어준 것은 감독이지만, 마룻장을 삐걱거리며 3층 목조가옥 안으로 걸어들어온 배우들은 영화 <장화, 홍련>의 실내를 변화시켰다. 사람을 대할 때는 대범하고 털털하면서도 주변의 소음, 냄새 같은 소소한 자극에 연신 “이게 뭐지” 하며 촉수를 곤두세우는 모습이 감독을 사로잡았던 염정아는 차고 강한 여자였던 계모 은주를 선병질의 과민한 인물로 탈바꿈시켰다. 그녀의 ‘계모’는 위압적인 강자가 아니라 지나치게 예민해서 상대를 질식시키는 강자다. 젊은 신인 임수정과 문근영에게는 영화의 공간과 한 덩이로 빚어졌을 때 관객을 매료하고야 말 모멘트가 있다. “이 아이가 정말 나를 보고 있나 나를 상대하고 있나” 시선에 따라 나이를 종잡을 수 없는 마스크를 가진 장화 역의 임수정이 우연히 콘택트 렌즈를 빠뜨린 날 김지운 감독은 그녀에게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몰아의 표정을 발견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람과 사람 아닌 존재가 분간없이 엉켜들며 서스펜스를 지탱하는 <장화, 홍련>에서 임수정이 지닌 맑은 진공은 혼돈의 거울이 될 것이다. 한편 동생 홍련(수연) 역의 문근영은 일종의 신비한 조명 같은 존재. 들여다보는 사람을 빠뜨리는 눈을 가진 그녀가 세트의 벽지 앞에 서 있으면 벽지의 꽃봉오리 무늬들이 별안간 일제히 망울을 터뜨린다.
김지운 감독에게 영화는 그렇게 배우가 더해지면 달라지고 그들을 세트에 세우면 한번 더 변색되고 편집을 하고 사운드를 입힐 때 다시 환골탈태하는 까다로운 생물이다. 흥미롭지만 위태로운 비즈니스인 셈이다.
“고지가 저기다라고 산을 올라보면 상상한 풍경이 아닌 거죠.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도 있고.” (웃음) 산은 내려갈 수 있지만 영화는 그럴 수도 없다. 첫 기술 시사 때에야 화들짝 충격을 받기도 한다. <반칙왕>은 편집, 사운드 다 입히고도 무슨 영화인지 알 수 없어서 “아마 예술영화인가봐”라고 말하며 다녔다가 “웃긴다”는 고무적인(?) 사전반응을 얻기도 했다.
<장화, 홍련> 현장에서 김지운 감독은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이따금 “이거 오락영화인데…”라며 갸웃거렸다. 스타, 균질한 내러티브 등 상업영화의 일정한 조건을 빗겨간 <장화, 홍련>을 그가 자신있게 오락영화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만든 세계에 관객을 몰두시키고, 그저 보는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체험하는 영화”로 만들겠다는 원칙 때문이다. 그렇다면 <장화, 홍련>에서 김지운이 두려워하는 실패는 무엇일까. “실패도 여러 가지 있겠지요. 흥행 실패도 있고 완성도가 미흡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제일 겁나는 게 있다면 일종의 실험들, 거창한 미학적 영화적 실험은 아니라도 개인적인 시도들이 이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나 감안없이 묵살당하는 일이에요.”
새해의 결심: 지독하고 야멸찬 감독
그는 요즘 하루에 여섯 시간쯤 잔다. 세 번째 장편영화와 씨름하는 감독의 꿈속에는 어떤 귀신들이 찾아올까. 몹시도 감동적인 장면을 찍고야 말았는데, 촬영감독이 말한다. “테스트인 줄 알고 카메라 안 돌렸는데요.” 개봉날 극장가를 찾았더니 몽땅 셔터가 내려져 있다. 아는 사람들이 “너 큰일났다”며 춤을 추기도 하고 브이자도 그린다. 김지운 감독은 가끔 푸하하 웃고 싶기도 하다. 영화라는 더없이 비현실적인 것을 만들면서 나는 왜 현실보다 더 강도높은 고통, 좌절, 시기심과 씨름하고 있을까. 정작 현실에서는 좀처럼 분노하거나 열정을 발휘하는 일이 없건만. 쉬워지는 문제는 한개도 없다. 영화의 궁극은 자꾸 저만치 달아난다. “전에는 영화 만들기의 차원이 세개쯤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한 차원이 열리면 다음 문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마주보는 두개의 거울 앞에 서 있는 것 같죠. 다가가면 앞의 상은 가까워지는데 뒤쪽 상은 저만치 멀어져요. 그렇다고 제자리걸음은 아닌 것 같지만. ”
하나뿐인 청중의 표정이 너무 멍했나보다. 김지운 감독은 새해 다짐을 특별히 알려준다. “가끔 써놓은 대사를 배우가 하는 걸 보면서 혼자 ‘아, 좋다!’ 하는가 하면, 그림으로서 한숏이 완전무결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족감에 대해 갑자기 냉정하고 싸늘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좀더 인간이 드러나야 했다던가 하는. 전에는 흔쾌하지 못한 부분을 무시하며 대세를 지체시키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편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연중에 자꾸 사람들 사정을 헤아리고, 촬영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영화적으로 해결하자 접고 넘어가는 습관도 정리할 요량이다. 그래서 다진 결심이 ‘새해에는 지독하고 야멸찬 감독이 되자’다.
수첩을 덮는데 김지운 감독이 다시 확인한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쓰는 거죠” “제일 궁금한 건, 지금 감독님의 고민이었죠.” 순간 적당한 고민을 들려준 걸까 살짝 수심이 스쳐간다. ‘지독한’ 김지운 감독이 상냥히 덧붙였다. “잘 생각해보고 알맞은 고민이 생기면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지운 감독은 아직 그를 놓아주지 않은 귀신 나오는 자매의 집을 향해, 나는 그의 새 영화를 궁금해하는 세상을 향해 헤어졌다. 글 김혜리 vermeer@hani.co.kr·사진 손홍주 lightson@hani.co.kr
<<<
이전 페이지
기사처음
다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