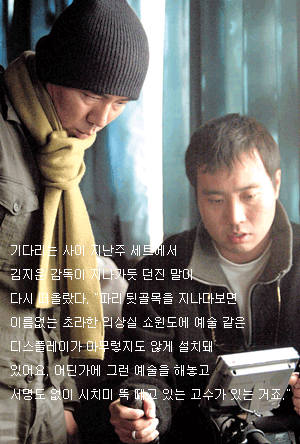<장화, 홍련>을 70%쯤 찍은 김지운 감독과 만나기 6시간 전. 시사회장에 자리를 잡고, 거른 점심을 때워줄 빵을 베어물기 위해 허겁지겁 입을 벌린 찰나, 전화가 울린다. 침이 꼴깍 넘어간다. “감독님 혹시 또 무슨 변고라도” “어, 밤에 약속이 생겨서요. 좀 앞당길 수 있을까 하구요.” “약속이 11시예요 그럼 8시면 괜찮겠네요.” “그러면… 한… 8시 반에 만날까요” “아, 8시 반이요” “어어, 아니… 45분으로 하죠.”여기서 플래시백. 일요일에 걸려온 전화로 애초 화요일 저녁이었던 약속은 월요일로 당겨졌다가 정작 월요일에는 수요일로 밀렸다. 그런데 마감 늦겠다는 한숨에 마음이 약해진 김지운 감독이 화요일 밤 10시를 허락한 것까지가 ‘지난 이야기’였다.
어쩄거나 약속 성사 과정부터 반전의 묘미와 공포를 절감하게 만든 김지운 감독과의 약속은 저녁 8시45분이라는 소심한 시각으로 마침내 낙착됐다.기다리는 사이 지난주 세트에서 김지운 감독이 지나가듯 던진 말이 다시 떠올랐다. “파리 뒷골목을 지나다보면 이름없는 초라한 의상실 쇼윈도에 예술 같은 디스플레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설치돼 있어요. 어딘가에 그런 예술을 해놓고 서명도 없이 시치미 뚝 떼고 있는 고수가 있는 거죠.” 김지운 감독은 그렇게 강자의 무감동함에 감동받는다.
그러니까 하물며 완결되지도 않은 영화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나 청해 듣는 건 어느 모로 보나 멋진 일이 못된다는 얘기를 넌지시 한 거다. 동감이다. 내가 영화 기자가 되려고 했던 건… 조금 더 가까운 자리에서 좀더 찬찬히 영화를 지켜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였다. 번민하는 촬영 중의 감독에게 말 좀 해보라고 채근하는 성가신 역할이 업무에 포함되어 있을 줄이야. 죽그릇 들고 조금만 더 달라고 조르는 올리버 트위스트의 기분에 공감하며 처량해져 있는데 등 뒤에서 김지운 감독이 등장한다. 예의 ‘나와 내 영화를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아님 말구’쯤으로 요약되는 오묘한 표정을 지은 채 120% 쿨하게.
제일 큰 골칫거리는 밀린 설거지
김지운 감독은 지금 생애 첫 장편호러영화인 <장화, 홍련>을 만드는 중이다. <조용한 가족> <반칙왕>으로 장진, 송능한 감독과 나란히 코미디 장르를 업그레이드한 삼인조로 꼽힌 그인지라, 장르만 따지자면 U턴이라고 거창하게 불러도 무방하다. 인터넷에서 개봉한 드라큘라 괴담 <커밍 아웃>, 옴니버스 프로젝트 <쓰리>의 한 에피소드인 <메모리즈> 등 그동안의 간주곡은 작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장화, 홍련>을 더욱 주목할 만한 빅게임으로 만들었다. 그나저나 뜬구름 잡지 않고도 의미심장한 대답이 나올 질문이 뭘까 “요즘 제일 큰 골칫거리가 뭐예요 ” “음…밀린 설거지요. 냄새날까봐 뒤집어만 놓고 나왔어요.” “숏은 잘 붙는데 신이 잘 안 붙는다구요 어떻게 잘 안 붙는데요” “(당연하다는 듯) 시간 순서대로 찍은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거 무슨 기사라구요” “<장화, 홍련>을 만들고 계신 감독님의 현재 상태.” “제 상태라면, 패닉 상태죠.” “<장화, 홍련> 찍으면서 새로 붙은 습관은 없나요 ” “아, 맞다. 휴대폰으로 노래방 다운받아요.” 허무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고보니 현장에서도 김지운 감독의 입에서는 마리안느 페이스풀부터 비틀스까지 들릴락말락 콧노래 메들리가 내내 이어졌더랬다. 그가 패닉 상태라면 그건 아마 고요한 패닉일 것이다. 크고 작은 망설임들이 콧노래 가락에 실려 맴돌다 제자리를 찾는. “사실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말로 코미디로 ‘떴지만’ 코미디를 정말 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웃을 줄은 몰랐어요. 그런 줄 알았으면 정말 더 웃기게 만들걸. 기껏해야 킥킥 웃을 거라 생각하고 썰렁한 느낌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영화가 관객과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비약과 변이를 발견한 김지운 감독은 그것이 창작자의 소관 밖이라는 사실도 동시에 깨달았다. 그러므로 남은 일은 사정이 허락하는 한 머무르지 않고 내 안의 이야기를 다양한 장르로 풀어내며 시작한 여행을 가능한 한 오래도록 계속하는 것뿐이다.
지금 그는 어디까지 왔나 감독이 돌아보는 <조용한 가족>은 영화적 인용과 패러디, 장르의 관습을 변주하는 즐거움의 영화였다. 그 와중에 빠뜨렸던 인간과 드라마를 주시한 코미디가 <반칙왕>. <반칙왕>이 뜻밖에 대중적인 코드로 읽히자 만든 소품이 <커밍 아웃>이었고 <메모리즈>는 김지운 특유의 건조한 정서가 파열음을 내며 부서질 때까지 밀어붙인 호러다.
그렇다면 <장화, 홍련>은 “징그러울 만큼 감정을 폭발시키는 영화”다. 환한 대낮의 정갈한 거실에서 엄마와 딸의 저주가 뱀처럼 독니를 세우는 실내극이다. 그래서 <장화, 홍련>은 생래적으로 감정 분출을 낯간지러워하는 김지운 감독에게 어렵다기보다 어색할 수 있는 영화다. 반면, 30대 남자 감독이 10대, 20대, 30대 여성이 전경을 점령한 드라마를 연출하는 데에서 오는 위화감은 엷다. 옷가게에서 맘에 드는 옷을 골라 카운터로 가면 “그거 여자옷인데요” 하는 일이 다반사인 감독의 취향 때문만은 아니다. <장화, 홍련>은 극히 보편적인 공포가 소녀들의 몸으로 강신(降神)하는 영화일 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오히려 <장화, 홍련>에 경련을 일으키는 공포의 그루터기는 열일곱살의 김지운 감독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던 날 느꼈던 무서움이다. “더이상 보호받지 못한다는 공포. 장화와 홍련(극중 이름 수미와 수연)의 공포는 그 무서움을 천만배로, 죽음을 압도하는 크기로 부풀린 것이죠.”
<<< 이전 페이지
기사처음
다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