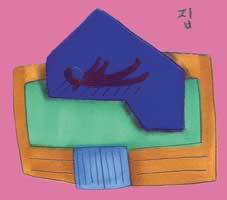나는 아직 <집으로…>를 보지 못했다. 모처럼 중편소설을 한편 쓴다고 앉아 있는 사이 한달이 훌쩍 지나버렸고, 무리를 했는지 이제는 며칠째 몸살을 앓고 있다. 다른 곳은 그럭저럭 회복이 돼가는데 목은 점점 더 아프다. 후배가 들고 온 도라지 청을 혀 끝에 올려놓고 빨아먹어도 보고 어머니가 보내주신 살구씨 기름을 눈 딱 감고 한 스푼씩 따라마셔도 별 차도가 없다. 사람 많은 곳에 나갔다오면 밤새 기침이다. 내가 <집으로…>를 보러 가지 못하고 있어도 여전히 <집으로…>는 절찬리 상영중이다. 내 목이 웬만해질 때까지 그러기를 바라고 있다.
<집으로…>라는 영화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내겐 뜬금없이 떠오르는 얘기가 있었다.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얘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이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이는 시골에 사는데 벌써 십오년째 집을 짓고 있단다. 보통 집을 짓는다고 하면 설계를 하고 재목을 구하고 할 것인데 그이는 오로지 주변의 돌을 집어다가 짓고 있단다. 하루에 돌을 열개도 쌓고 스무개도 쌓고 틈나는 대로 어느 날은 두 시간도 짓고 세 시간도 짓고 어느 때는 며칠을 짓기도 하는 세월이 쌓이니 이제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한다. 조금만 서두르면 완성이 될 터인데 십오년 전부터 하던 대로 하고 있단다. 이, 삼개월이면 집 한채가 뚝딱 지어지는 세상인데 십오년이라니. 나는 그이가 어떻게 생겼으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어서 그 집을 구경가고 싶었는데 아직 못 가고 있다.
이 도시로 나오기 전에 나도 집에서 살았다. 샛문이 달린 파란 대문 집이었는데 대문 안에는 마당이 있었다. 대문에서 마루까지 가는 데 한참 걸렸으니 꽤 넓은 마당이었다. 우물이며 꽃밭이며 감나무며 머위대며 헛간이 다 그 마당 안에 모여 있었다. 그 집을 떠나오고 난 뒤에야 나는 내가 그 집의 마당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도시로 나와 쪽방과 문간방과 독신자아파트와 오피스텔 따위를 전전하는 동안 늘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이 그 집의 마당이었던 것이다. 그래서일 것이다. 지금도 어딜 가나 마당에나 있음직한 것들이 눈에 띄면 유심히 응시하게 된다. 세차장의 수돗가에서 꽥꽥 대고 있는 기름이 묻은 새끼오리나 네모난 스티로폼 상자 안에서 자라고 있는 봉숭아꽃이나 근사하게 가지를 뻗어내린 유실과 나무나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게 되는 우물… 뭐 그런 것들. 처음에는 응시하는 것으로 그만이었는데 근자에는 마당을 상기시키는 것들을 만나게 되면 목을 길게 빼고는 그 주변을 기웃대며 마치 거기에서 무슨 맛있는 냄새가 흘러나 나오는 듯 흠흠, 거리기까지 한다.
지난 봄에 우연히 지금은 타계한 화가의 집에 들른 적이 있었다. 나무껍질로 이은 것 같은 둥근 지붕이 먼 곳에서 봐도 눈에 띄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고개를 쳐들고 한참을 올려다봐야 했다. 바닥은 손으로 일일이 박은 게 분명한 손바닥만한 벽돌이 나름의 도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있었다. 천년은 갈 것 같은 무쇠난로와 작업대가 보는 사람을 압도하고 있었다. 타계한 화가는 그 집을 누구의 도움없이 손수 지었다고 했다. 날마다 바닥의 벽돌과 씨름했으나 다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했다. 창을 내어 풍경을 보기 시작하면 작업을 하지 않게 된다면서 천장을 높게 하는 대신 창을 내지 않았고, 몸이 따뜻하면 긴장이 풀어진다면서 난방 또한 하지 않았으며, 편한 의자가 곁에 있으면 앉고 싶어진다면서 푹신한 소파를 두지 않았다고 했다. 역시 그가 손수 만들었다는 딱딱한 나무의자가 몇개 무쇠난로 옆에 고독하게 놓여 있었다. 집이라기보다는 작업실에 더 가까웠던 셈이다. 그 집을 서성거리며 내가 집이란… 하고 생각했던 개념을 수정하면서 긴장했었다. 한번도 마주한 적은 없지만 그 집을 지은 화가의 뜻이 고스란히 전해져왔다.
나는 누구나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집에서 살게 되면 지금보다는 인간관계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락방이나 헛간같이 가끔 혼자 숨어들어 책을 보거나 잠이 들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살게 되면 추억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것이 축적되어 생의 가치관을 풍요롭게 세워줄 것이라는 증명되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연유로 시골에까지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게 나로선 안타깝기 그지없다. 가능하면 마당도 있으면 좋겠지. 하지만 쉬운 일이라야 말이지. 꿈만 꾸니 가끔씩 진짜 꿈속에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의 다락방이나 뒤란, 헛간이 등장하기도 한다. 요새는 여기저기 줄장미가 하도 예쁘게 핀 것을 보고 나도 언젠가는 담벼락 밑에 저런 걸 심어봐야겠다, 생각했다. 방금 한 생각이라고 여겼는데 다시 짚어보니 어렸을 적 그 집의 담장에 줄장미가 불타고 있었던 것에 생각이 미쳤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소멸하고 없는 어린 시절의 집으로 돌아가길 꿈꾸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 집에 있던 그 깊은 우물은 어쩐담? 그걸 지금도 집안에 팔 수 있나? 나 자신 어처구니가 없어 눈만 껌벅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