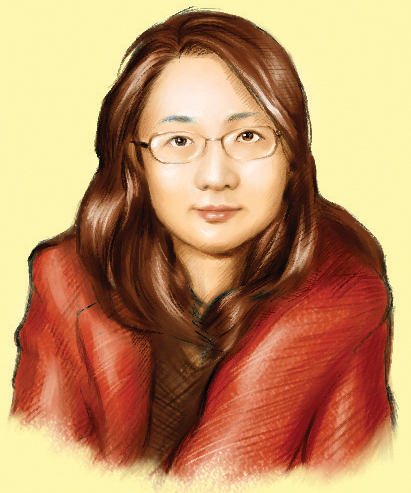6년 전에 나는 직장을 구하지 못한 졸업예정자였다. 이력서는 세번밖에 쓰지 않았고, 쓴다 해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았다. 운전면허도 없던 내가 이력서에 적을 수 있는 건 **대학 **과 졸업예정이 고작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씨네21> 공채에 떨어지고도 박한 원고료와 교통비에 고마워하면서 출퇴근하는 객원기자가 되었다. 괜찮을 거라고, 한달에 50만원만 벌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마감에 바쁜 정식기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버스를 타기 위해 혼자 만리동 고갯길을 걸어내려오다보면 눈물이 날 때도 있었다. 심지어 자리도 구석이었고, 누군가 쓰다버린 컴퓨터에는 포르노 사이트만 잔뜩 등록돼 있었고, 정말 명함을 갖고 싶었다.
그때 내가 찾아낸 위안은 버스 정류장 맞은편 어느 대기업 빌딩이었다. 밤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똑같은 크기의 수백개 창문 어느 하나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숨이 막혀서 눈물이 마르곤 했다. “저런 건물에선 절대로 일하지 않을 거야.” 면접시험을 보면서 딱 한번 정장을 입어본 나는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 견고한 빌딩을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내가 모르는 거대한 사업의 일부가 되지는 않겠다고. 실업자일수록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처음 산 비싼 코트를 입고선 그렇게 다짐했었다. 누군가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라고 비웃어도, 나도 비웃으며 맞받아쳤을 거였다.
몇년이 지나서 나도 마감에 바쁜 정식기자가 되었지만 같은 빌딩을 보며 가끔 그때를 기억하곤 했다. 받아주지도 않았겠지만, 안 가길 잘했어. 버티지 못했을 거야. 2월2일 밤에 올림픽공원에서 다시 회사로 돌아올 때까지는 그랬었다. 그날 마릴린 맨슨이 두 번째 한국 콘서트를 했다. 부산영화제를 포기하고 처음 콘서트에 갔을 때처럼, 마릴린 맨슨이 언제 다시 한국에 올지 몰라서, 마감 한가운데인 수요일임에도 꼭 콘서트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제가 출근을 할 테니까 보내주세요, 라고 편집장과 합의를 보았다. 지난번 체조경기장보다는 자그마한 무대. 망사 스타킹 신은 코러스는 없었어도 사무실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쟤, 조증 도졌냐?”라고 말할 정도로 마음에 좋고 몸에 좋은 음파를 실어서 돌아왔었다. 하지만 음악과 마찬가지로 심신에 좋았던 건 나처럼 사무실에서 막 뛰어나온 듯한 비슷한 또래 사람들이었다.
내 바로 앞자리 여자는 꼭 끼는 코트를 입고 조금 늦게 도착해서 머리를 질끈 묶더니 마찬가지로 꼭 끼는 니트 차림으로 깡충깡충 뛰기 시작했다. 그녀 말고도 정장이라 할 만한 옷차림 그대로 가터벨트 입은 록가수의 콘서트에 온 사람이 여럿이었다. 분명히 저녁을 먹지 못했을 것이고, 대충 치우고 온 업무도 아직 그들 어딘가에 머물러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달랐다. 바보처럼, 창문이 똑같다고 해서, 사람도 똑같을 거라고, 왜 내 맘대로 결정해버렸을까. 매주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날마다 다른 시간에 출근한다고 내가 뭔가 다른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닐 텐데.
누군가 하는 말을 받아 적어 기사를 만들다보면 가끔은 ‘나는’이라는 단어가 무척 고파지곤 한다. 고만고만한 셔츠와 넥타이를 입었어도 나보다 생기있었던 그 사람들은 어쩌면 나보다는 자주 자신의 주어가 되고 있을 것도 같다. 그러니까 결국엔 여우와 신포도였을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