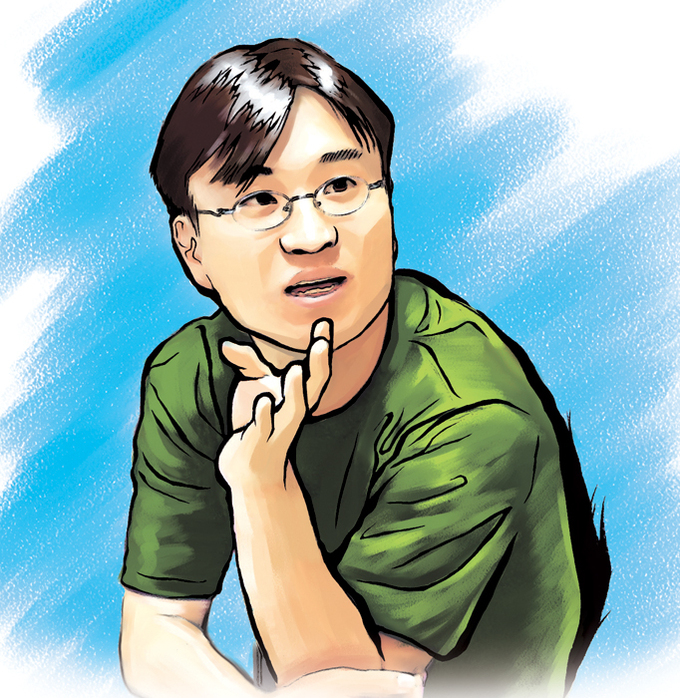언제부턴가 회사에서 섀도 스포츠를 즐긴다. 섀도 스포츠가 뭐냐고. 상대가 없어도, 도구가 없어도, 즐길 수 있는 가상의 놀이다. 주변 환경은 나쁘지 않다. 회사 천장이 낮은 편인데 배구 네트로 생각하고 붕 날아서 스파이크를 날릴 수 있다. 기분이 그만이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물론 그런 격렬한 움직임은 자제한다. 회사를 방문한 이들이 얼마나 놀랄 것인가. 그럴 때는 간단히 탁구의 스매싱이나 테니스의 백핸드 스트로크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심신을 달랜다. 이럴 땐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 손에 들고 있는 신문이나 잡지를 라켓 대신 활용하는 게 좋다.
누가 보면 미친 짓이다. 그래도 가끔 반응을 보여주는 동료들이 있어 고맙다. “허리 다칠라”라는 걱정부터 “아직 멀었다. 올림픽을 혼자서 치를 수 있으려면 좀더 열심히 하라”는 조언까지 아끼지 않는다. “아예 여러 가지 자세를 연결동작으로 한데 묶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쪽에 건강체조 아이디어로 응모해보라”는 제안도 한다. 심지어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주는 이도 있다. 한 후배는 허공에 스트레이트를 날리는 것을 보고 있는 것만으론 미안했나보다. 그 따뜻한 마음 덕에 3년 넘게 인간 샌드백을 치는 기분을 만끽하고 있다(펀치를 날리면서 후배의 아내에게 항상 죄송한 심정이다).
지금은 안 계셔서 아쉽다. 회사 경비를 맡으셨던 분 중에도 섀도 스포츠를 알아보시는 이가 있었다. 성함은 잘 모르겠으나 말 붙이기 좋아하는 싹싹함의 소유자였다. 마감하고 있을 때면 순찰하는 그분을 볼 수 있었는데, 그냥 묵묵히 돌아가시는 일은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감에 치인 동료들 중엔 그분의 과도한 대화 시도를 부담스러워 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나도 처음부터 호의를 가졌던 것 같진 않다. 그러다 한번은 무심결에 회사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와인드업 자세를 취한 적이 있다. 그걸 본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다. “표정을 보니까 볼이네요∼.”
비슷한 케이스이긴 한데 쪽팔린 적도 있다. 2001년 여름이었을 것이다. <아라한 장풍대작전> 촬영장에 잠시 놀러갔을 때다. 잠실운동장 분수대 근처에서 촬영했을 텐데, 밤 늦게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 장대우산을 챙겨갔다. 류승완 감독은 한참 심각한 터라 말 붙이기가 좀 뭣했다. 취재를 간 것도 아니어서 그냥 주위를 어슬렁거렸다. 그러다 마침 들고 온 우산이 떠올랐다. 왼팔을 펴고 힘찬 스윙을 몇 차례 날렸는데, 마침 류승범의 매니저였던 K씨가 다가와 이렇게 물었다. “필드에 가끔 나가시나봐요?” 잔디는 무슨, 채도 한번 못 잡아봤는데. 당시엔 야구 타격자세를 취한 것뿐이라고 답했던 것 같다.
왜 이럴까. 유년 시절에 못 놀아서일까. 흔한 오징어놀이 한번 못하고 중학교에 갔으니 말 다했다(요즘 아이들은 그런 놀이를 하지도 않겠지만). 억압된 것은 필히 몸을 찾는다던데, 섀도 스포츠의 시작도 그런 거창한 무의식적 기원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르겠다. 봄 같지 않은 봄이 계속되는 요즘이다. 올해는 정말이지 땀 흘리며 뭐라도 시작해야겠다. ‘혼자가 아니야’라고 중얼거리는 동수 찾기 놀이도 이제 그만 해야 할 듯 싶다. 동수도 좀 쉬어야지 않겠나. 어쨌든 진짜 상대 찾아 힘을 써볼 요량이다. 주어진 삶에 버팅 한번 날려볼 때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