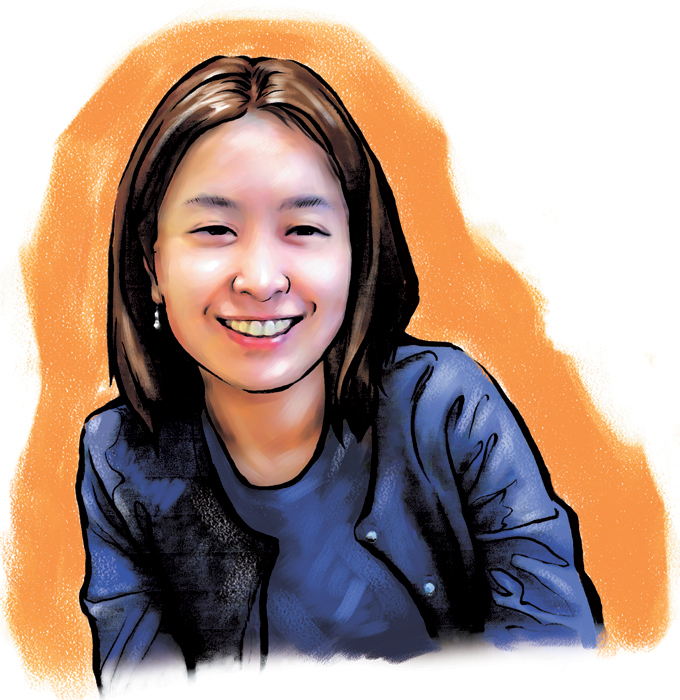2주 전 일요일, 여느 때처럼 교회에 갔다. 예배 시작과 동시에 전화 한통을 받았다. 나로 인해 곤란에 처한 누군가의 하소연이 담긴 전화였다. 통화가 제법 심각해질 것 같아서 예배당 밖을 나갔다. 그의 하소연은 절절했다. 그러나 이미 일은 벌어진 뒤였고, 해결책은 없었고, 결정적으로 그것은 나의 잘못으로 비롯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모적인 통화였다. 나는 점점 화가 났다. 그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면서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내 입장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게 나를 화나게 했다. 그는 거의 울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었다. 그러려면 먼저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군요’라는 사과를 해야 했다. 그 말은 할 수 없었다. 사과함으로써 내가 하지 않은 잘못이 내가 한 잘못인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객관적으로도 잘못한,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정황상의 내 정당함을 포기하지 않았다. 미안하단 인사를 참고, 이성적인 몇 문장으로 통화를 끝냈다.
자리로 돌아오고 나서 점점 흥분이 일기 시작했다. 동생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기다렸다는 듯 자초지종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실 그건 자초지종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전화 통화가 나란 인간을 얼마나 비겁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나는 토로했다. “내가 왜 미안하다고 해야 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런데 왜 내가 그 사람한테 이런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하냐고!”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 목소리는 높아졌다. 그것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방해했다. 누가 봐도 불쾌하고 무례한 행동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게 느껴졌다. 나의 양옆, 앞뒤 사람들이 욕을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나는 그걸 알면서도 통제하지 않았다. 나는 심지어 울기 시작했다.
염통이 미어지도록 소리내 울고 있을 때 내 오른편 옆자리의 여자가 물티슈를 건네왔다. 그녀는 예배 시작 전에 하도 산만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려서 내 눈총을 받은 사람이었다. 바로 옆에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 같기도 했고, 하여간 그 시선놀림이 정신없고 싫어서 나는 드러내놓고 짜증을 표시했다. 내 눈총을 받았던 그 사람은 별말없이 물티슈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예배에 집중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녀는 왼쪽 팔을 쓰지 못했다.
나는 밖으로 나갔다. 격해진 울음을 다스리며 그 사람에 대해 생각했다. 어차피 나와 무관한 사람이니 나의 한번의 짜증에 받을 상처가 없어 그렇게 순수한 배려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의 행동은 별수없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조금 전까지 내가 내세웠던 이성과 정당함의 논리가 대체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 휴대폰을 열어 아까 통화했던 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안하다는 내 말에 괜찮다는 눈웃음의 답변이 왔다. 하소연을 하고 나니 자기 맘도 더 편해진 것 같다고 그가 말했다. 그에게도 고마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