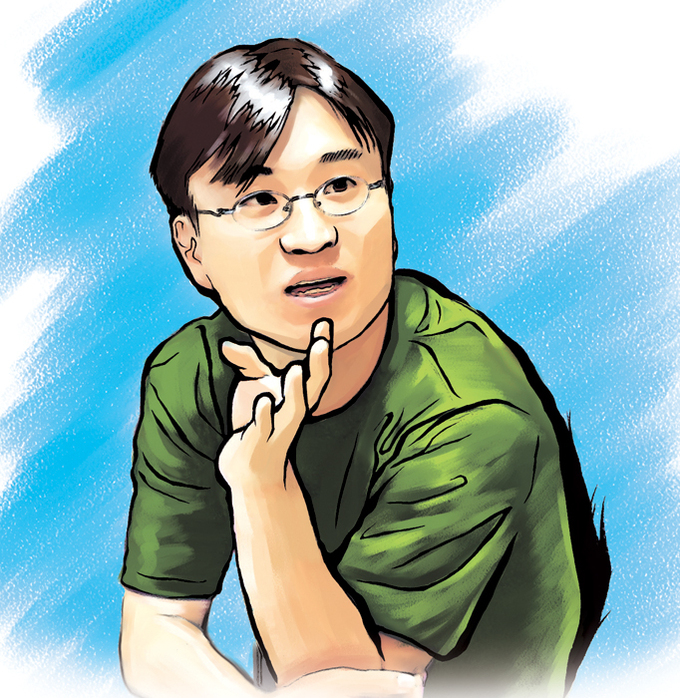옛날이야기를 긁어모아 쓴 지가 꽤 됐다. 2001년쯤에 단성사의 오랜 역사를 훑었던 게 처음이었는데, 고루한 성향 탓인지 명절 합본호용 올드 스토리들은 다 내 몫이 됐다. 검열사, 마케팅사, 한가위흥행사, 에로영화사, 소품사 등을 비롯해 최근의 종로극장 흥망사까지. 독자들의 반응이야 미약하기 짝이 없었으나, 어쩌랴! 내 입장에서도 기획회의를 앞두고 아이디어 고갈에 시달리느니 취재자원의 보고인 충무로 소사를 나서서 들추는 게 건강에도 좋았다. ‘떡국이나 송편이 엄청 맛있어서 명절에 먹는 건 아니잖아?’라고 자문하면서 말이다.
문제는 매번 거저먹을 수 없었다는 거다. 단성사 기사만 하더라도 조상림 선생의 꼼꼼한 기록 덕분에 땅 짚고 헤엄치기였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런 행운은 좀처럼 찾아들지 않았다. 한가위흥행사를 쓸 때는 한겨레신문사 서고에 꽂힌 연도별 신문 스크랩 뭉치들을 일일이 한장씩 넘기며 추석 무렵의 영화 포스터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오래된 신문을 뒤적인 적 있는 이들은 알겠지만, 먼지 때문에 목이 아픈 건 둘째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 때문에 온몸이 가렵다. 손이 근질근질하면 등이 근질근질하고, 나중에는 눈까지 부비느라 정신없다.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나마 다행. 검열사를 쓸 때는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들락거리며 심의문서를 얻어보려고 애썼으나 헛수고였다. 자원 재활용은 낙제, 문서 파기는 선두. 아 대한민국이여. 얼마나 씨부렁거렸는지 모르겠다.
기록이 일천하니 구술만이 유일했다. 그러나 이 또한 만만치 않았다. 유일한 증언을 해줄 것만 같은 이들의 소재를 간신히 알아내 연락을 취하면 병상에 누웠거나 세상을 이미 뜬 이들이 많았다. 주변 취재를 위해서는 1명이라도 더 만나야 했고, 이를 위해 때론 전화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장시간 통화를 지극히 싫어하는 어르신들의 습성을 미처 파악 못한 부탁이었다. 실제 뵙게 되는 경우라도 난관이 남았다. 한국 영화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효과적인 인터뷰가 될 터인데, 경청 자세만으로는 원로영화인들의 시대한탄을 방어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 취재가 충분하다고 자족하고 돌아왔으나 뒤늦게 어르신들의 기억들이 뒤엉키고 엇갈려 있음을 깨달았을 때의 낭패감이란.
믿는 구석이 없었다면 올해 봄부터 한국영화후면비사를 2, 3주에 한번씩 쓰겠다고 나서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일하는 젊은 연구원들 덕분에 3D 취재의 수고는 훨씬 줄었다. 한국영화구술총서인 <한국영화를 말한다> 시리즈나 <신문기사로 본 한국영화> 같은 책들은 일반 서점에서 독자들에게 좀처럼 눈길을 받지 못하지만, 적어도 내 책장에서만큼은 몇년째 한가운데 VIP 대접을 받고 있다. <한국영화를 말한다>의 경우, 1년에 한권씩 내놓겠다는 것이 한국영상자료원의 약속이었으니, 2007년이 다 지나가는 지금 신간이 나올 때가 됐다. 이번엔 그 안에 어떤 옛날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궁금하다. 사실 속마음은 대규모 지원을 통해서라도 한국영상자료원의 구술 채록 작업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르신들의 기억의 문이 언제까지나 열려있진 않을 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