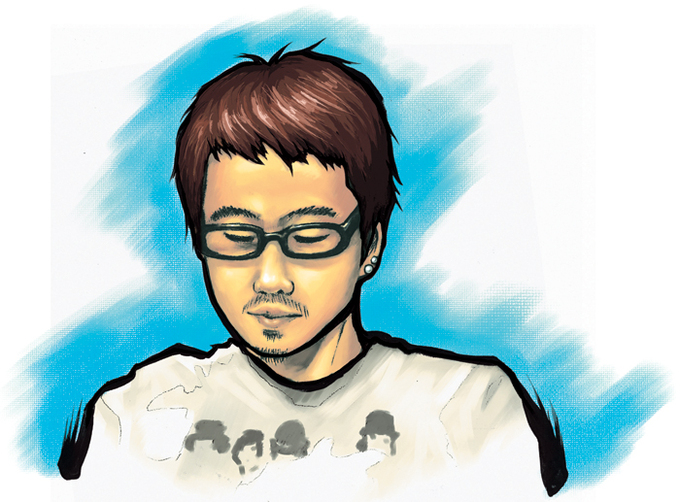한동안 참았던 이베이질을 재개했다. 유명 피겨 제작사인 맥팔레인(McFarlane)에서 만든 <괴물들이 사는 나라> 피겨 세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다. 모리스 센닥의 그림책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정교하게 재현한 이 피겨 세트는 지난 2000년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잠시 판매된 희귀 아이템이다. 만 하루를 남겨놓은 현재가격 157달러. 아마도 자정을 기점으로 200달러가 넘게 치솟겠지. 하지만 원작을 본 순간부터 간절히 바랐던 피겨 세트다. 이성이 돌아왔을 때 즈음에는 이미 국제배송을 기다리는 신세가 될 것이 틀림없다. 뭐 어쩌겠는가. 별스런 취향과 덜 자란 좌뇌가 결탁해 쌈짓돈을 공략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괴물들이 사는 나라>는 모리스 센닥이 지난 1963년에 출간한 작품이다. 몇 페이지 안 되는 아동용 그림책이니 내용도 간단하다. 말썽꾸러기 소년 맥스가 늑대 옷을 입고 엄마에게 장난을 치다가 벌로 방에 갇히고 만다. 깜깜한 방은 맥스의 상상력이 빚어낸 거대한 바다와 숲으로 변하고,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한 끝에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 도착한 맥스는 괴물들의 군주가 되어 즐겁게 축제를 벌인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스물이 넘어 처음 본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는 어딘지 좀 음험한 구석이 있었다. “엄마를 잡아먹어버릴 거야!”라고 말하는 괴상한 꼬맹이는 자라면 하키 마스크를 쓰고 부모에게 칼을 휘두를 기질이 다분하고, 상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험도 야만의 본능과 아동용 일러스트의 괴이한 불협화음이었다. 아아, 계몽사에서 계몽적으로 재편집한 그림동화 대신 이런 걸 읽으며 자랐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그러고보면 한국 작가나 감독들의 별볼일 없는 상상력도 다 위인전과 계몽도서로 가득했던 어린 시절과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흥미롭게도 <괴물들이 사는 나라>는 스파이크 존즈에 의해 영화화가 진행 중이며, 이미 본 촬영을 끝마치고 편집 단계에 들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존즈의 영화는 원본 그대로 개봉 못할 가능성이 크다. 워너브러더스와 레전다리 픽처스가 이미 완성된 영화를 갈아엎고 새로운 감독을 고용해 재촬영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흉흉한 탓이다. 그들이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기술적 완성도. 짐 헨슨이 만든 코스튬을 이용해 실사를 찍고 괴물들의 얼굴만 CG로 합성하겠노라는 존즈의 야심이 썩 결과가 좋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거야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수정 가능한 일일 테고, 진짜 이유는 존즈의 예술적 비전과 워너의 수익계산이 불협화음을 일으켰기 때문이리라. 인터넷 포럼들에 따르면 할리우드 파사데나에서 열린 테스트 스크리닝에서는 무섭다며 징징대는 애들로 가득했다고 하니, 가족용 블록버스터가 7500만달러짜리 아트하우스영화로 변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을 워너 경영진의 얼굴이 눈에 선하다.
그럼에도 워너브러더스가 수천만달러를 들여 재촬영을 감행할 수 있을까? 물론이다. 그들은 이미 폴 슈레이더의 <엑소시스트> 프리퀄이 마음에 들지 않자 레니 할린을 고용해 영화를 완전히 새로 찍은 경력이 있고, 지난해에는 <브이 포 벤데타>의 제임스 맥타이거를 고용해 올리버 히르비겔이 완성한 <인베이젼>을 새롭게 찢어발기기도 했다. 두편 모두 결과는 엉망이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거다. 워너브러더스는 수천만달러를 허공에 날려버리더라도 자신들의 의지를 결행할 투사-자본주의적 기량의 소유자라는 것. 한심한 일이다. 이럴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왜 스파이크 존즈를 감독으로 낙찰했던 걸까. 얌전한 추수감사절 가족용 영화를 바랐다면 크리스 콜럼버스나 론 하워드 같은 무채색 인종들을 고용할 일이지. 나로서는 워너브러더스가 1989년의 교훈을 되돌아보기만을 바랄 따름이다. 그들은 <유령수업>에 반해 팀 버튼을 <배트맨>의 감독으로 고용했고, 대중을 상대로 한 첫 스크린 테스트 결과는 당연히 형편없었다. 워너는 경악했다. 사상 최대의 제작비를 투여한 히어로 가족영화가 한 망나니의 아트하우스영화로 탄생해버렸으니 말이다. 그러나 재편집없이 개봉한 영화는 그해 최고의 흥행작이 됐고 팀 버튼이라는 새로운 예술가를 찾아냈다. 만약 워너가 1989년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인베이젼>과 <엑소시스트>의 낭비를 또다시 감행할 예정이라면? 제발이지 감독으로는 알란 스미시를 고용하시고 스파이크 존즈의 비전은 감독판 블루레이로라도 출시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