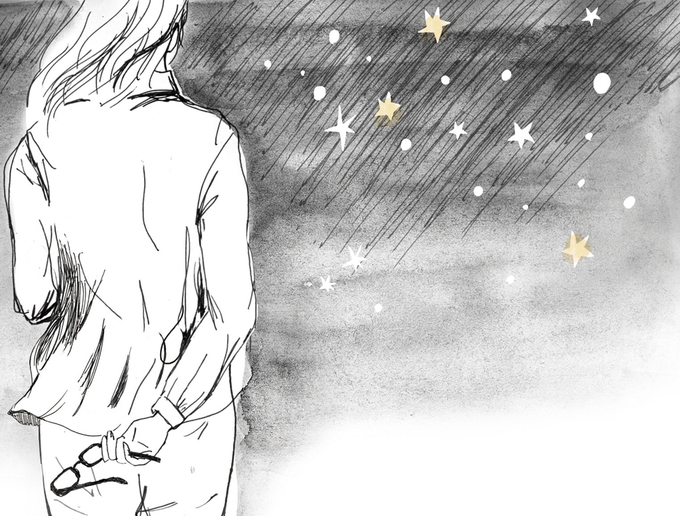선거 결과를 보고 울었다. 울면 지는 건데. 누구한테든 화풀이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내 안의 치졸한 악마가 슬금슬금 기어나와 이런 말을 할 때까지 내버려두었다. “내가 앞으로 강원도랑 충청도에 가나봐라. 가서 10원짜리 한장 쓰나봐라.” 하지만 그런 치사한 생각으로 계속 분노만 하고 있으면 내 자신이 한없이 작고 무기력해질 것 같아 마음을 추스르고 도서관에 갔다. 안빈낙도, 이너 피이스, 웃자 웃어. 그러다 문득 달라이 라마의 책 <용서>를 읽었다.
달라이 라마의 책을 읽고 금방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고 하면 내 속은 편하겠지만 사실 그건 아마도 기만일 거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모욕하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미움이나 나쁜 감정을 품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이분은 중국 정부가 그토록 티베트인들을 탄압했는데도 중국인들을 미워하지 않는단다. “중국 공산당과 투쟁하는 것이지. 일반 중국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하시며. 맞는 말이다. 하지만 대오각성하지 못한 내 느낌은 다르다. 그게 국가든 민족이든 종파든 간에 어딘가에 속해서 그 공동체의 힘 아래 순응하고 있으면 누구나 그 ‘당파의 죄수복’을 입게 된다고 에머슨이 말했다. 그러니 적어도 그 ‘죄수복’을 지각하며 반성하는 정신 정도는 있어야 한다. 독일인들처럼. 그래서 여하튼 뭐, 나는 인종주의, 민족주의, 국수주의, 지역주의 등 개인을 억압하고 집단성을 강조하는 똘마니들을 보면 울컥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지난가을 회사를 박차고 나올 때 생각이 난다. 이놈의 조직이란 게 좀 과하게 말하자면 조폭과 다름이 없다. 한마디로 아무리 ‘지랄’ 같아도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한다는 거다. 하지만 그때 난 더이상은 싫었다. 조직의 위계질서가 행하는 그 넌더리나는 권위에 엿이나 먹어라 싶었다. 그래서 꽈당 부딪히자 마음먹었다. ‘앗쌀’하게 갈비뼈에 금이 가도록. ‘거침없이 하이킥’으로다가. 회사라는 조직과 그 관리자들에게 느낀 어떤 막연한 반항심이 내 느릿한 정신 속에서 서서히 자라다가 마침내 폭발하는 상태까지 다다랐던 것 같다. 그래서 정말 갈 데까지 갔다. 비겁하기 짝이 없는 최후의 필살기까지 선보이며. 사람을, 심지어 오랜 시간 함께 지낸 직속 상사를 그렇게 대하는 것은 매우 무례하고도 배은망덕한 짓임에 틀림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식적인 사랑이나 존중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다. 세상에는 사랑의 에너지도 있지만, 증오의 에너지도 있는 법이니까. 난 그 오래된 애증의 힘에 일종의 도박을 걸었던 셈이다.
쳇, 그런데 졌다. 도박은 실패했고 나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하지만 한번도 나의 선택을 후회해본 적이 없다. 떠나보면 안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손수건으로 내 눈을 가리고 있던 이런저런 공동체를 벗어나면, 이 세상에 사랑하고 경험하고 배우며 연대감을 가질 만한 것들이 얼마나 무수히 많은지 알게 된다. 정말 저 하늘의 별처럼 많다. 이 지면에서 그 많은 자잘한 것들에 대해서 써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