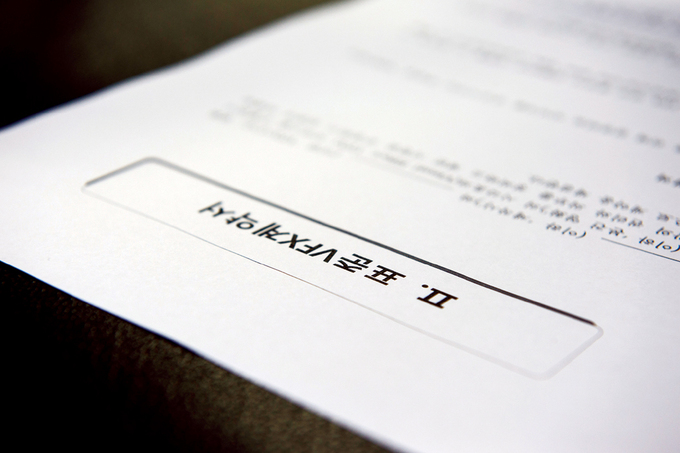최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표준VFX계약서 권고안’을 발표했다. 영진위에 따르면 “표준VFX계약서는 VFX리스트와 견적서에 근거한 작업내용의 정량화, 작업기간의 보장, 작업료 분할 지급, 계약완료 시점의 명확화, 작업내용 변경과 작업 승인 절차의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 이 표준VFX계약서는 이미 3년 전부터 논의가 시작됐던 내용이다. 오래 묵은 과제이지만 그 내용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만큼 업계 현실이 과거와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계약기간은 오늘부터 영화가 개봉할 때까지, 작업은 제작사가 오케이할 때까지 무한반복, 오케이를 했어도 다시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렇게 작업을 해도 추가비용은커녕 원래 받아야 할 작업료마저 떼먹히는 경우가 빈번하다. 게다가 2006~2008년 한국 영화계가 침체기를 겪으면서 작업 단가가 대폭 인하됐고, 지금까지 그 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경영상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최근 순제작비 100억원이 넘는 블록버스터영화들이 즐비하고, 그만큼 투여되는 물량도 많아지고 있으니 관련 업체들도 호황을 누리지 않겠느냐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오히려 현재 국내 CG업체들 대부분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고, 그나마 여력이 있는 회사들은 사정이 열악한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보다 중국 영화시장이나 게임시장으로 탈출할 기회만 엿보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CG업체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촬영장비, 보조출연, 미술, 편집, 오디오, 후반작업, 포스터, 스틸 등 이른바 ‘제작서비스업’이라고 불리는 업계 전반이 오래전부터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한국영화 시장이 관객수 2억명을 돌파하며 전례 없는 흥행기록을 세우고 있지만, 그 뒤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스탭과 제작서비스 업체들이 착취에 가까운 처우를 감내하며 이 시장을 지탱하고 있다. 그들에 대한 합리적인 배려와 처우 개선이 없다면 한국 영화산업의 미래는 유지되기 힘들다.
지난 한해 스탭 처우에 대해서는 영화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CJ 등 대기업이 이에 동참하면서 부족하나마 많은 결실이 있었다. 반면 영화산업의 또 다른 한축인 제작서비스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심 부족으로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CT산업(문화기술산업)의 핵심인 CG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얘기를 10년 전부터 하면서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 효과는 오리무중이다. 그보다는 표준계약서 하나라도 제대로 정착시키는 것이 업계에 더 큰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권고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되는 표준계약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