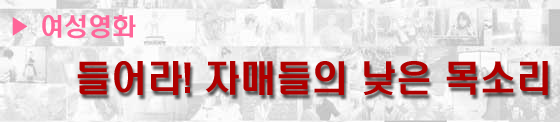‘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는 슬로건은 서울여성영화제의 것만이 아니다. 내년 봄으로 기약된 여성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그린 영화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기가 지루하다면, 올 가을 부산영화제에 들러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부산에도 여성에 포커스를 맞춘 영화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풍성해지고 있으니 말이다.박은영/김현정
막달레나 자매들 The Magdalene Sisters
▶ 오픈 시네마/영국/피터 뮬란/2002년/119분
▶ 11월19일 오후8시 부산시민회관,11월22일 오후2시 부산시민회관
신앙의 이름으로 억압받은 여성의 역사, 그 무덤에 꽃을 바치라. 막이 오르면 강간당한 소녀가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 축제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귀엣말로 이 ‘사고’의 전말이 퍼져나가는데,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 소녀에게 꽂히는 시선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책망과 경멸이다. 졸지에 소녀는 방탕한 죄인으로 몰리고 참회를 위해 수녀원에 보내진다. 너무 어리숙하거나 똑똑해서, 너무 아름답거나 추해서, 부모와 사회로부터 ‘죄인’으로 판정받은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된 노동과 학대의 시간, 노예와 다름 없는 삶이다. 수녀들은 원생들의 세탁 노동으로 벌어들인 돈을 세며, 반항하는 원생들을 매질하고 모욕하며 거듭 말한다. “너희는 이제 세상의 악과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리라.” 그 ‘잔인한 자비’ 앞에 원생들은 생기와 의욕을 잃고 시들어간다.
여성판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 부를 만한 <막달레나 자매들>은 보는 이의 가슴에 격랑을 일으키는, 매우 선동적인 영화다. 저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 그것을 판단하고 단죄할 수 있는 이는 누구인가, 반발하고 분노하지 않기는 힘들다. 1960년대 아일랜드의 한 수녀원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됐던 억압과 착취의 기록을 다룬 이 영화는 ‘당연하게도’ 바티칸의 심기를 건드렸고 거센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켄 로치 영화의 배우(<내 이름은 조>의 주연배우)답게 ‘좌파’ 성향을 지닌 피터 뮬란 감독은 카톨릭 교단의 적의에 찬 반응에 “카톨릭 교회가 아일랜드에서 어떻게 젊은 여성들을 억압했는가를 보여주는 영화가 아니라, 여성의 자유와 성, 교육, 노동의 신성함을 억압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모든 신앙을 비난하는 영화”라고 항변한다. 그 말이 옳다. 이 영화가 건드리고 있는 건 특정 신앙이나 사건이 아니라, 보편적인 여성의 문제다.
모번 켈러의 여행 Morven Callar
▶ 월드 시네마-비평가 주간/영국/린 램지/2002년/97분
▶ 11월20일 오전11시 부산3, 11월22일 오후2시 부산3
남자친구의 죽음을 애도할 것인가, 축하할 것인가. 어느 날 갑자기 모번 켈러의 남자친구가 죽어버렸다. 남자친구의 시체 너머엔 ‘미안하다’는 유서와 함께 그가 생전에 쓴 소설 원고가 보인다. 모번 켈러의 선택은 그녀는 남자친구의 ‘유산’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새 삶을 시작한다. 남자친구의 시체는 토막 내서 매장하고, 사람들에겐 그가 떠났다고 말한다. ‘너를 위해 썼다’는 소설엔 자기 이름을 달아 출판사로 보내고, 그의 은행 잔고를 털어 여자친구와 남스페인으로 여행을 떠난다. 친구와 다툰 뒤 홀로 남은 모번 켈러는 런던의 출판업자와 만나 차기작 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모번 켈러의 여행>은 남자친구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사건을, 지리멸렬한 자신의 인생을 뒤바꾸는 발판으로 적극 활용하는 한 젊은 여성의 당돌한 심리적 여행기로, 대담하지만 부드럽고, 부드럽지만 센티멘털하지 않은 영상과 잘 어우러지고 있다. 친구의 죽음 이후, 자기만의 세상에 스스로를 유폐시키는 소년의 이야기 <쥐 잡이>에 이은 린 램지의 두번째 작품으로, 올 칸영화제에서 호평받았다.
바닷가에서 Seaside
▶ 월드시네마/프랑스/쥘리 로페스 퀴르발/2002년/88분
▶ 11월17일 오후5시 대영1,11월19일 오후2시 부산2
남겨진 이들이 떠나간 이들을 이해할 때 바닷가 작은 마을. 여름이면 관광객으로 흥청대고 겨울이면 권태와 침묵에 휩싸이는 곳. 서로를 속속들이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마을 사람들은 그러나,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불안정한 삶 속에서 각자 다른 고민에 잠겨 있다. 자갈세공 공장에서 일하는 마리는 고향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한다. 남자친구 폴은 빠친코에 중독된 노모를 돌보느라 마리의 꿈을 이해할 여력이 없다. 마리의 상사 알베르가 해고된 날, 마리와 폴의 관계도 허물어진다. 현실과 꿈, 사랑과 증오, 이해와 불신으로 얽힌 이들의 관계는 여름과 겨울, 두 계절 속에서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그 얼굴을 드러낸다. 그러나 떠난 사람들과 남겨진 사람들. 어느 쪽이 더 행복할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올해 칸영화제에서 신인감독상에 해당하는 황금카메라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여성 교도소 Women’s Prison
▶ 새로운물결/이란/마니제헤크맛/2002년/106분
▶ 11월15일 2시 대영3,11월20일 5시 대영3
여성, 나의 친애하는 적, 나의 끔찍한 동지여. 수년 전 자파르 파나히 감독은 <써클>을 통해 여성의 범죄와 비행을 부르는 이란 사회의 구조를 이야기한 바 있다. 탈옥하거나 출옥한 여성들이 반나절의 유랑 끝에 다시 감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 슬프고 답답한 이야기. 여기, 감옥 속의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뤄보겠다며, 아예 감옥으로 들어간 여성이 있다. 마니제 헤크맛이라는 이름의 여성 감독은 이란의 여성 죄수들에 대한 방대하고 생생한 리서치를 토대로 완성한 시나리오 <여성 교도소>를 들고 실제 감옥에 들어가 75일간 카메라를 돌렸다. 극영화라기엔 너무 리얼한 <여성 교도소>의 카메라는 감옥에 갇힌 20년의 세월을 통해 ‘이란 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이야기한다.
이란의 한 여감옥. 제멋대로인 여죄수들을 통제하기 위해 새로운 교도관이 부임해 온다. 말을 듣지 않는 죄수들은 엄벌하는 등 교도관은 서서히 자신의 통제권을 넓혀가지만, 어머니를 구하려고 양아버지를 살해해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미트라가 눈엣가시다. 미트라는 교도관과 사사건건 부딪치지만 때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 등 기묘한 애증의 세월을 함께한다. 그 사이, 유난히 예쁘던 소녀 죄수는 성추행당한 뒤 자살하고, 간수와 죄수 사이엔 마약 거래가 시작된다. 옥중에서 태어난 아기는 천덕꾸러기 문제아로 자라나 감옥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리는 감옥의 철문.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지만,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미트라는 이미 초로의 노파가 돼 있다.
<<<
이전 페이지
기사처음
다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