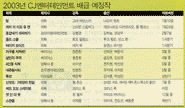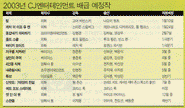충무로, 구조조정은 시작됐다
지금으로선 CJS연합에 관한 갖가지 추측과 상상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러나 CJS연합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지금 충무로가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들어섰음은 분명하다. 벤처, 금융자본이 너도나도 영화에 투자하던 최근 2∼3년의 이례적 호황이 사그라지면서 새로운 돈줄을 찾기 위한 행보가 빨라진 것이다. 플레너스 지분 매각문제가 의미심장한 것도 이런 대목이다. 영화계 관계자들이 입을 모으는 것은 2003년이 제작사들엔 매우 혹독한 한해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굳이 CJS연합이 아니라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본은 부족하고 제작사는 넘치는 상태이므로 제작사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챔피언> <연애소설> <굳세어라 금순아> <중독> <품행제로> <이중간첩> 등에 투자한 소빅창투의 손석인 팀장은 “배급사 대 제작사의 수익지분이 현행 6 대 4에서 7 대 3이나 8 대 2까지 변할 수 있으며 제작사가 흥행손실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 나눠갖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제작사가 콘텐츠의 힘으로 투자, 배급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던 시대가 가고 돈을 가진 쪽이 우위에 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제작사들에게 2003년의 ‘보이지 않는 위험’은 그렇게 다가오고 있고 영화계가 CJS연합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이런 정황 때문이다.글 남동철 namdong@hani.co.kr
02년 배급사별 관객동원 현황
03년 시네마서비스 배급예정작
03년 CJ엔터테인먼트 배급예정작
충무로 돈줄, 어떻게 바뀌어왔나?토종극장 -→ 대기업 -→ 금융자본
80년대까지 한국영화 제작의 주요 자금원이 된 것은 극장이었다. 각 지방 배급업자로부터 미리 돈을 받아 제작비를 마련하는 이른바 ‘입도선매’의 시대. 한국영화의 최고 전성기로 알려진 60년대부터 시작된 이런 제작방식은 정부가 영화사의 수를 제한하는 동안에도 지속됐다. 흥행자본을 제작에 투자하던 ‘입도선매’는 1988년 직배 실시와 더불어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다. 독점적 외화 수입으로 부를 축적했던 영화사들은 할리우드 직배사에 대항할 길이 없다고 판단, 제작편수를 줄여갔고 그러는 사이 비디오라는 새로운 매체가 안방으로 파고들었다. 대기업이 영화업에 뛰어든 것은 비디오를 통해서다. 삼성, 대우 등 가전제품을 팔던 대기업은 비디오 시장에서 영화의 가능성을 보게 됐다. 1992년부터 두 회사는 한국영화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기업의 영화계 진출엔 상당한 수업료가 필요했다. 무엇보다 흥행결과가 그들의 예측을 벗어나기 일쑤였다. 대기업이 제작보다 외화수입에 더 많은 돈을 쓴 것은 당연했다. 적어도 한국영화보다는 외화가 흥행예상에 가까운 결과를 보여줬던 것이다. 비디오 시장의 성장세도 90년대 후반부터 반전됐다. 비디오 판권으로 안정된 수입을 얻는 것도 차츰 옛말이 되자 대우, SK, LG 등이 영화에서 철수했다. 비교적 과감한 투자로 1998년 유력한 메이저 배급사로 부상한 삼성영상사업단마저 <쉬리>가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는 동안 해체 결정을 내리자 영화계의 대기업 시대는 막을 내리는 듯 보였다. 비디오 사업에서 시작하지 않은 CJ만 남게 된 상황.
한편 대기업이 돈만 쏟아붓고 철수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 서울극장과 손잡은 강우석 감독과 영화계에 들어온 최초의 금융자본인 일신창투가 새로운 큰손으로 떠올랐다. 시네마서비스는 대기업에 비디오판권을 팔고 지방 배급업자로부터 선금을 끌어오는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며 제작을 멈추지 않았고 일신창투는 대기업에 비해 가볍고 빠른 움직임을 무기로 제작투자에서 적지 않은 수익을 거뒀다. <은행나무 침대>가 일신창투의 첫 투자작으로 성공하자 영화계 진출을 엿보던 다른 금융자본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민기술금융, 산은캐피탈, 미래에셋캐피탈 등이 일신창투의 뒤를 따랐다.
금융자본의 시대는 KTB, 무한창투 등이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 2000년부터 화끈 달아올랐다. 일정한 투자액을 모아 조합을 결성해 영화에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영상전문투자조합은 2000년에만 138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2001년에 새로 생긴 투자조합 9개를 합하면 2년간 모두 2015억원의 돈이 영화계로 유입되거나 투자 대기 상태였다. 그러나 당초 많은 영화인들이 우려했듯 금융자본은 수익률이 낮으면 언제든 영화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이었다. 2002년에 상당한 손해를 본 몇몇 금융자본은 영화계를 떠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런 변화 속에서 메이저 배급사로 자리를 굳힌 쪽은 오히려 시네마서비스와 CJ다. 이중 CJ는 대기업인 동시에 멀티플렉스 체인을 안정적 자금원으로 삼는 회사.
어찌 보면 한국영화는 80년대까지 제작자본이 됐던 흥행자본에 다시 의지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는지 모른다. 비디오 판권을 비롯한 기타 판권이 유력한 재원이 되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선 극장에서 회수된 돈만큼 제작에 의지를 보일 자본은 별로 없어 보인다. 물론 금융자본이나 대기업 자본이 어떤 식으로든 제작에 참여하겠지만 극장에서 회수된 돈이 영화제작에 다시 투자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멀티플렉스 체인을 설립한 동양, 롯데의 동향이 궁금해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 어쨌든 당분간은 극장 자본, 대기업 자본, 금융 자본이 공존하는 ‘과도기’가 지속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다.